인간 공자의 그 제자들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논어 읽기
《논어》, 사람을 읽다 ― ‘개인’의 발견
《논어》는 공자 사후,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모이고 한참 뒤에 편집된 문헌이다. 따라서 《논어》는 기록자의 취지와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1천 2백 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에 이루어진 《논어》의 편찬은, 우리가 오늘날 읽는 책과는 무척이나 다른 공정을 거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용과 여러 가지 조건을 토대로 일어난 ‘획기적 사건’이었다. 책을 만들고 그 책에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다.
《논어》의 텍스트는, 오늘날의 우리가 읽기에는 꽤 불친절하다. 이른바 ‘대화’라고 보기에는 문맥이 뚝뚝 끊기고, 문장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건넨 말인지를 명확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수많은 《논어》 주해서가 존재하는 이유다.
《논어, 학자들의 수다: 사람을 읽다》의 저자 김시천은 이 책에서 통상 《논어》의 조연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이 ‘주연 같은 조연’ 또는 이른바 ‘씬 스틸러’로 재조명되는 과정이 이 책의 몸통이라 할 수 있다. 논어에서 ‘선생님/공 선생님이 말했다’로 시작하는 문장은 전체의 약 45퍼센트로, 나머지 55퍼센트는 공자의 제자들 또는 다른 역사적 인물들이 하는 말이다. (‘논어’에는 제자만 해도 29명, 공자나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125명 등장한다.)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하는 제자 열두 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논어》 속 텍스트의 틈새를 스토리텔링하듯 메꿔 나간다. 그 결과, 그 시대 ‘공자학단’을 이룬 다양한 캐릭터들의 삶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논어》를 읽을 때와 미묘하게 다른 길들을 보여준다. 다 같은 길이 아니라 각각의 길로 갔음을 보여주는 발자국들이 은밀하게 드러난다.
나는 《논어》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옛날 옷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옛날에 입었던 옷이 오늘날 다르게 변한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논어》가 현재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옷을 다시 입으려면 수선을 해야 합니다. 《논어》 읽기에서도 바로 그 수선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이 전통사회에서 갖는 《논어》의 지위나 의미가 현대사회에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_ 프롤로그 ‘《논어》, 사람을 읽다’ 중에서
십인십색 《논어》 읽기 ― 제자들은 공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 책은 《논어》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1부의 문을 연다. 저자는 몇 가지 통계를 통해 기존의 시각과 다른 읽기 전략을 펼친다.
이어서 2부에서는 공자의 벗이자 제자였던 ‘자로子路’와 수제자로 알려진 ‘안회顔回’ 이야기를 다룬다. 《논어》를 읽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 뒤에 숨겨진 삶을 조금은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무인 출신이고 나이도 많았던 자로는 공자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지만, 그의 개성과 소신은 변하지 않으며 《논어》의 이야기에 생생함과 재미를 불어넣어준다. 이와 달리 안회는 아주 어린 나이에 공자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을 철저히 익히지만, 신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묵묵히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한다. 이 길은 뜻밖에도 향후 《장자》로 이어지게 된다.
3부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인 ‘자공子貢’이 등장한다. ‘공자학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공자 사후 ‘유가’를 확립하는 흐름의 한가운데 선 인물 자공.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위대한 성인 공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이 점에 특히 중점을 두어 3부 3장 전체를 할애해 자공을 다루었다.
4부에서는 세 인물을 다룬다. 유가 전통에서 배반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리적 사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사조의 개척자로 보이는 ‘재아宰我’, 공자학단에서 공부했지만 공자의 바람과 다른 길을 찾아간 현실적인 인물 ‘염구?求’,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 중 후대의 영향력으로 볼 때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받는 ‘증삼曾參’이다. 저자는 《논어》 독자들에게는 매우 친숙할 이 세 인물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관점을 뒤집어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5부에서는 공자 사후 유가 내부의 분화分化와 개성을 잘 보여준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 유학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한 자하의 ‘경학經學’과 자장의 ‘유술儒術’ 등을 다루는 한편, 마지막 장에서는 ‘사적인 삶을 향유하려는 독특한 인생관’의 맹아를 보여주는 민자건閔子騫.중궁仲弓.원헌原憲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여기서 《논어》에서 《장자莊子》로 이어지는 색다른 전통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에필로그에서는 ‘자子(선생님)’라는 호칭이 붙은 공자의 제자들 중 하나인 유약有若을 통해 사상과 종교로서의 유교, 집단이자 학파로서의 유가가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를 보여준다.
이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상 《논어》는 공자에 대해 가장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책이 되며, 더 나아가 ‘네가 되고 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목차
프롤로그 《논어》, 사람을 읽다
1부 《논어》, “이 사람을 보라!”
1장 ‘철학’에서 ‘삶’으로 | 《논어》, 인간의 발견
《논어》는 공자의 책인가? / 통계로 본 《논어》의 재구성 / 또 다른 주인공, 《논어》 속 사람들 / 상식의 눈으로 《논어》 읽기 / 《논어》로 《논어》를 읽다 / 사제 모델, 《논어》의 이야기 양식 / ‘대화’에서 ‘이야기’로 / 《논어》 속 인간, 개성의 발견
2장 ‘제자’에서 ‘주인공’으로 | 스스로의 삶을 찾아간 공자의 제자들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다 / 언행, 개성의 표현 / 시대마다 다른 《논어》가 있다 / 개념에서 이야기로, 《논어》를 읽는 새로운 눈
2부 ⋮자로와 안회⋮“운명이여, 안녕!”
3장 자로 | 운명을 바꾼 만남과 의로운 죽음
공자와의 만남, 자로의 운명을 바꾸다 / 변화, 진정한 용기를 배우다 /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가 되다 / 영원으로 통하는 의로운 죽음
4장 자로에서 안회로 | 공자와 또 다른 세계
유랑하는 영혼, 탈속을 꿈꾸다 / 스쳐간 인연, 또 다른 삶의 가능성 / 안회는 정말 공자의 수제자일까? / 안회, 벼슬을 거부하다
5장 안회 | 침묵하는 지식인의 현실과 고뇌
요절한 안회는 어떻게 성인이 되었는가? / 사문의식, 인간의 주체적 자각을 열다 / 안회가 죽자 공자가 통곡하다 / 공자가 안회에게 극기복례를 말한 까닭 / 안회의 도, 《장자》로 이어지다
3부 ⋮성인과 자공⋮
“메멘토 모리, 죽은 자를 기억하라”
6장 자공 1 | 흐르는 강물처럼
《논어》 탄생의 기원 / 공자가 대화한 유일한 제자 / ‘절차탁마’를 말하다 / 자공의 인정투쟁과 공자의 처방 / 상인의 아들, ‘문’을 가슴에 품다 / 흐르는 강물처럼
7장 자공 2 | 세상으로 통하는 문
공자의 속마음을 읽다 / 문사철을 겸비한 지성 / 더불어 사는 삶의 정치를 배우다 / 장강의 앞물결과 뒷물결 /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8장 자공 3 | 공자학단의 설계자
공자의 유학, 자공의 유가 / 공자, 성인이 되다 / 《논어》, 그 기록의 출발 / ‘문’과 ‘서’의 계승, 유가의 탄생 / 공자마을의 유래
4부 ⋮재아・염구・증삼⋮
“어디에나 길은 있다”
9장 재아 | 길이 갈라지는 징후, 도의 탄생
재아, 또는 유교의 가롯 유다? / 재아는 누구인가? / 재아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 / 재아의 새로운 논리학 / 재아가 본 공자 / 갈라진 길에서 새로운 도가 탄생하다
10장 염구 | 비틀거리며 도를 따라가다
현실주의자 염구 / 뛰어난 실무자 / 스스로 역부족을 말하는 소심남? / 비틀거리며 도를 따르다
11장 증삼 | 전전긍긍하는 유학자의 길
공자 학통의 중심? / 효의 대명사, 증자 / 아내를 내치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증삼 / 반성의 철학자, 그리고 충서
5부 ⋮자하・자장・덕행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12장 자하 | 텍스트의 제국, 경학의 탄생
만년의 제자들 / 텍스트의 제국을 열다 / 공자의 가르침 보전, 경학의 탄생 / 너는 네 길로, 나는 내 길로: 논쟁의 시작 / 공문의 ‘학’에서 제국의 ‘학’으로
13장 자장 | 논쟁의 시작, 유학과 유술
학과 술, 유가의 두 날개 / 유술의 탄생 / 역사에서 처세를 배우다 /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를 보전하는 지혜 / 리틀 자로, 자장
14장 민자건·중궁·원헌 | 《논어》에서 《장자》까지,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
‘노장’에서 ‘논장’으로 / 벼슬을 거부한 민자건 / 군주가 될 만한 천민, 중궁 / 장자로 넘어가는 가교, 원헌
에필로그 십인십색 《논어》 이야기
참고도서
저자&기여자
ㆍ지은이 김시천
- 소개
- 동양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상지대학교 교양대학에서 공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4년부터 인문학 전문 팟캐스트 〈학자들의 수다〉를 제작, 진행해 왔고, 2020년부터는 유튜브에서 새로운 인문학을 소개하는 방송 〈휴프렌즈〉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지혜를 모색하는 방송 〈휴애니프렌즈〉에 출연하고 있다. 그동안 쓰고 옮긴 책으로, 『철학에서 이야기로』, 『이기주의를 위한 변명』, 『노자의 칼 장자의 방패』, 『논어, 학자들의 수다 : 사람을 읽다』, 『무하유지향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장자』, 『죽은 철학자의 살아 있는 위로』(공저),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공역), 『펑유란 자서전』(공역) 등이 있다.
보도자료
저작권 안내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해 자료의 전체 내용은 물론 일부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ll material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may not be edited or reproduced in other media without permission.
It is prohibited to use all or part of the materials, including for tra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or systems, without authorization.
연관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니, 지원이 필요하면 해당 프로그렘 제작사로 문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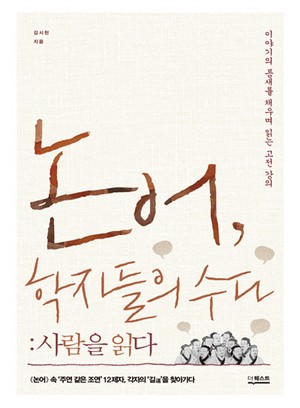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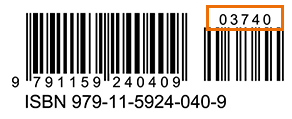



독자의견 남기기